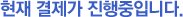현재 위치
- H
- JOURNAL
JOURNAL
오혜에서 연재하는 수필 및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4
- b급 사랑의 말로
- Essay
- 12-17-2017

영화를 끔찍이 좋아했다. 이십 대 후반에는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열망으로 영화판에 뛰어들기도 했다. 어떤 날은 영사되는 이야기에 푹 빠져 하루에 세네 편씩 영화를 이어보기도 했고, 되도록이면 편애하는 장르 없이 골고루 보려 노력했다. '나 이런 영화도 보는 사람이야' 하고 뻐기고 싶은 허영을 참지 못해 발음하기도 힘든 감독들의 작품에 수차례 도전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번번이 '이 감독 대체 뭔 얘길 하고 싶었던 걸까. 다시 환불 받을 순 없겠지' 하는 표정으로 엔딩 크레디트를 마주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 게 어디냐, 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했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뿌리내린 취향의 자기(磁氣)에서 벗어나긴 힘든 법.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는 영화 중 어째선지 유독 강하게 끌리는 유형이 있었으니 그것들의 특징은 보통 이러했다. 1) 개봉 전 삼십 분만에 만든 게 아니냐고 묻고 싶게 하는 포스터 비주얼. 2) '폭발적 반응', '관객 일동 기립' 등 왠지 전혀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의심을 품게 만드는 홍보 문구. 3) 저예산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동시에 블록버스터라고 우김. 4) 인터넷 영화 평점란에 '나만 당할 순 없지' 라는 코멘트와 함께 별점 만점을 준 네티즌의 유무. 그 밖에 대표하는 특성이 더 있으나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한 달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아 (건강상)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한다. 여기서 이미 눈치챈 동지가 있을는지. 그렇다. 나는 이른바 B급이라 불리는 장르에 매번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는 B급 마니아였다.
나의 B급 사랑이 단지 영화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음악이든 책이든 제품이든 '와우, 당최 진지하고 쓸모 있는 구석을 찾아볼 수 없잖아' 라고 탄성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면 대책 없이 달려들었다. 타인의 간섭이나 승인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고 싶은 걸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본의 선택에 구걸하듯 천편일률적으로 행동하는 주류에 대한 반항 정신에 만족을 느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제법 폼이 나겠지만, 그냥 재밌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반면 B급 따위 상대하기도 싫다는 얼굴로 '도대체 이딴 건 왜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한다. '거참, 대놓고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고상한 취향을 잣대로 쉽게 힐난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보다 기어코 꽁꽁 숨기고픈 졸작이라도 만들어낸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된다. 행동파들이 좋은 것이다.
몇 해 전 겨울, SNS의 타임라인을 훑다가 우연히 이미지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괴수처럼 커다란 소시지가 건물을 붕괴하며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림이었다. 이건 또 뭐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영화제 포스터였다. 이름하여 '인천 국제 비엔나 소시지 영화제'. 흐음, 콧구멍 가득 차오르는 B급의 향기에 취해 그만 H에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H씨,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오오, 여성분과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얼마 만인지. 일주일 후 H와 영화제에 갔다. 어땠냐고 묻지 마라. 첫 영화부터 불필요한 내러티브는 귀찮다는 식으로 남성의 고환을 20분이나 확대해 보여줬다. 영화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B급 따위 상대하기도 싫다는 얼굴이 되어 지하철 안에 앉아 있었다.